2012.04.08 17:13
기사 내용과 사진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꼭 밝혀주세요. 특히 상업용으로 쓰실 때는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 사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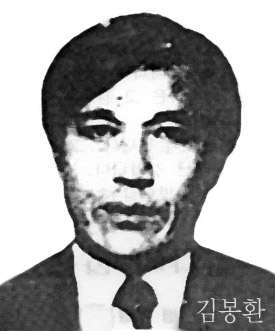
▲ 故김봉환 노동자. ⓒ 추모연대
원진레이온 김봉환 노동자.
20년 전 오늘은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으로 사망한 그의 기일이다. 1991년 1월 5일 사망한 김봉환 노동자의 죽음은 137일간의 장례 투쟁으로 이어졌다. 당시 故김봉환 노동자의 사망 대책투쟁은 대대적인 연대활동으로 발전하면서 현장 노동자 파업과 시위 동참까지 이끌어냈다. 그 속에서 ∇원진 직업병 인정범위 확대 ∇정부의 직업병 예방 6계년 계획수립 ∇전현직 노동자 역학조사 실시라는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
다음은 당시 상황을 정리한 내용(1998년 노동과건강연구회 10주년 기념토론회『전환의 시대, 노동자 건강의 어제와 오늘』자료집 중 ‘산재추방운동 10년의 경과와 평가(김은희)’ 발췌 및 재구성)이다.

▲ 회사 정문 앞에 차려진 빈소. 평화롭게 하려던 장례식은 경찰폭력이 발단되어 '장례투쟁'으로 이어졌다. ⓒ 한겨레신문
김봉환 씨는 1977년 원진에 입사하여 원액2과에서 일하던 중 두통과 손발 저림 등 이황화탄소 중독 초기 증상을 얻어 1983년에 퇴사했다. 그는 말을 더듬는 증상이 악화되어 사당의원에서 진찰한 결과 이황화탄소중독 의증 및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렇지만 노동부는 원액2과가 유해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요양을 불승인했다. 점차 병이 진행되던 김봉환 씨는 1991년 1월 5일 자신의 외동딸 고등학교 입학금을 접수하고 집으로 돌아온 직후 사망했다.
김봉환 씨의 죽음이 알려지자 당시 새로이 조직되었던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노동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노동부 측은 김봉환 씨의 죽음이 직업병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회사 측도 책임을 회피했다. 수차례의 집회와 항의에도 노동부와 회사 측이 책임을 방기하면서 장례식조차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시신이 심하게 부패하여 결국 3월 31일 장례식을 진행하는 중, 회사 정문에서 경찰이 유가족을 집단폭행하면서 평화적 장례식이 무산되고 말았다.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 장례를 치르던 유가족과 원진노동자들은 경찰 폭력에 부닥치자 시신을 회사 정문 앞, 폭행의 현장에 놓은 채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 故 권경룡 씨의 자살을 다룬 당시 경향신문 기사. ⓒ 경향신문
이후 사회 각계가 더욱 힘있게 동참하면서 연일 농성장 앞에서 집회가 계속되었다. 그 시기에 박수일, 김장수 씨 등이 직업병 판정과 함께 사측으로부터 퇴사를 강요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급기야는 어렵게 치료를 받던 권경룡 씨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원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작업장 내부에서 강경한 파업투쟁에 돌입하면서 싸움은 급진전되었다. 국회에서도 5월 6일 진상보고를 통해 김봉환 씨의 죽음이 직업병 탓임을 주장했다. 결국 노동부와 회사 측이 승복하면서 136일에 걸친 긴 싸움이 마무리됐다. 1991년 1월 5일 추운 겨울에 돌아가신 김봉환 씨는 신록이 짙어가는 5월 21일에야 장례식을 치렀다.
故김봉환 씨의 사망은 다시금 정부의 직업병 은폐를 규탄하고 산재추방 여론을 대대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연대활동으로 발전했다. 마침내 현장 노동자들이 파업과 시위 등 직접 동참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직업병 예방 6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만들었다. 원진 직업병 인정범위가 확대됐고 전·현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역학조사도 실시하게 됐다. 이 역학조사에서 120여 명의 직업병 환자가 새롭게 발견됐다. 나아가 직업병 인정기준을 개선하는 중요한 근거를 확보했다.
| 故 김봉환 노동자 생애 |
출생 1936년~1991년 (당시 52세) 사망일 1991년 1월 5일 약력 출처 : 추모연대 |